법 제정 교통·공간·정보전달 제약 없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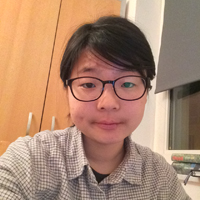
독일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웠던 점은, 대부분의 버스(적어도 예나Jena의 경우 모든 시내 버스)가 저상 버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에 계단이 없으며 버스가 정차할 때면 보도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승객들이 수월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버스뿐만이 아니라 트램(Tram)이라고 불리는 지상에 다니는 작은 기차 같은 시가전차도 독일에서는 보편적인 교통 수단인데, 간혹 휠체어를 탄 승객이 있으면 트램 기사 아저씨가 손수 나와 승객이 내리는 걸 도와주곤 한다. 주말에는 휠체어를 탄 시민이 가족들과 한가로이 길을 거니는 광경도 종종 보인다.
일상 풍경이 된 장애인의 외출은 독일 사회에서 교통 약자가 갖는 이동권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매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상 버스 도입의 실태는 꽤나 지지부진하다. 반면, 독일의 저상 버스는 1987년부터 자리잡기 시작한 만큼,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축은 독일사회의 사회 기반 시설 설계에 보편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접근성’(Barrierefreiheit)이라 불리는 이 원칙은 그대로 풀이하면 ‘장벽을 없애자’는 의미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공공시설의 장애물 제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바로미터로 적용된다.
저상 버스 도입은 비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쓸데 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상 버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들,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그리고 간혹 무거운 캐리어와 짐을 날라야 하는 사람들 또한 포함된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지라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큼이나 이동권이 제한된 사람들(Mobilitaetseingeschraenkte Menschen)이다.
‘접근성’ 원칙은 2002년에 제정된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대한 법률’(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 BGG)에서 구체화된 개념으로, 교통에서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공간적, 그리고 의사소통매체에서의 장애물 제거 또한 포함한다. 이는 ‘사회적 보호 대신 자치권이 통합정치를 향한 원칙’(Selbstbestimmung statt Fuersorge ist Richtschnur der Integrationspolitik)이라는 결론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자치권’ 개념은 공공 시설을 타인의 도움 없이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 가능한 환경적 조건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언뜻 보면 장애인의 ‘자치권’ 개념은, 장애 또한 개인의 책임이므로 혼자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자치권’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손길 없이도 사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기반, 자율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은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동권은 일차적으로 교통시설을 사용하는 데 가해지는 물리적 제약으로부터의 탈피에서 더 나아가, 교통·공간· 정보전달분야에서의 ‘접근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치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체적인 개인들이 통합된 공동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된다.
독일은 앞서 언급한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교통·공간·정보전달 분야의 제약을 없애가는 데 점진적으로 노력해왔다. 한국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미 이동권과 접근권을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제도적인 실태는 법에 쓰여진 만큼을 따라가지 못한다. 언제쯤 법에 명시된 권리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도 저상 버스가 일반적인 버스로 다루어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전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