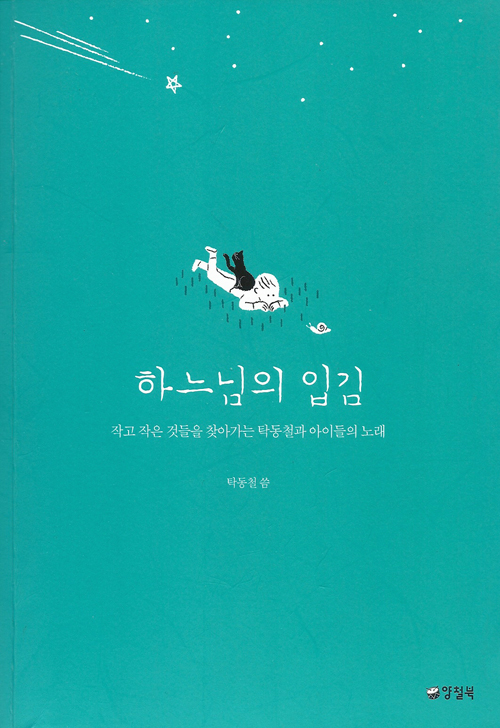
탁동철이 가만히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다.
“두 시 가운데 저는 뒤에 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앞에 시는 사람 냄새가 안 납니다. 하지만 뒤에 시는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납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실 이 말은 전에 그가 어느 글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글’로 읽었을 때와 이렇게 직접 그 앞에서 ‘소리’로 들었을 때는 달랐다.
‘사람 냄새가 안 난다!’
나는 이 한마디로 그동안 답답했던 것을 풀 수 있었다. 깔끔하게 잘 쓴 것 같은데 왜 그 시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가를, 잘 찍은 풍경 사진인데 왜 그렇게 낯설고 차갑고 정이 안 갔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 시에서는 사람 냄새가 안 났고, 그 풍경 사진에는 사람과 그 흔적이 없었다는 것을.
유홍준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면 사진이 아주 많이 실려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거의 다 사람이 문화유산 앞에, 뒤에, 곁에 서 있다. 금강산 내금강 보덕암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이 돌층계 쇠줄을 잡고 서 있다. 고은 시인이다. 유홍준은 사람이 없을 때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올 때까지 기다려서 찍는다. 유홍준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그 유산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효과 말고도,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유산과 풍경이 더 살갑게 다가오는 것일 게다.
김찬곤
광주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