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하운의 ‘개구리’에 얽힌 사연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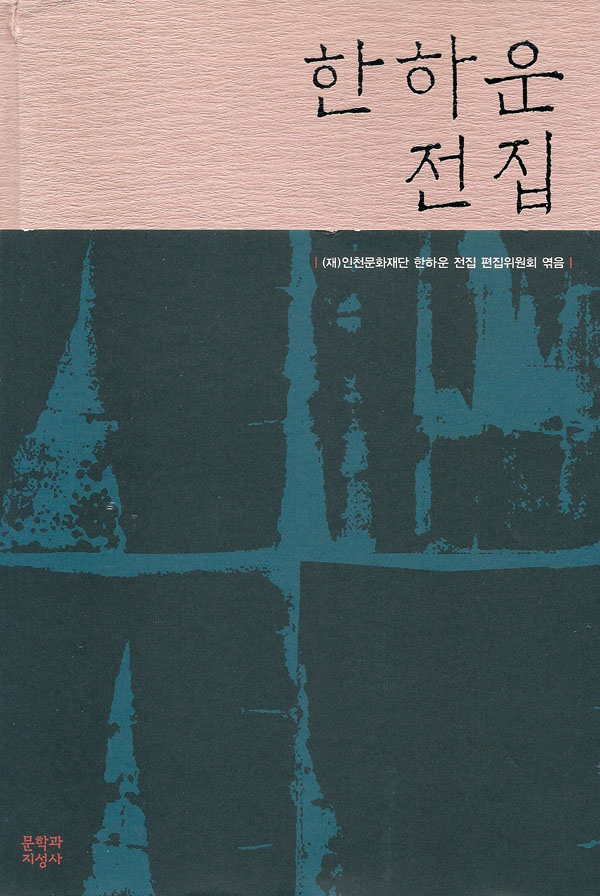
한하운은 한센병 약을 구하러 삼팔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온다. 이때부터 거지가 된다. 밤에는 다리 밑에서 거적을 덮고 자고 아침이면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들어가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는다. 봄여름가을은 버틸 만했다. 문제는 겨울이었다.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추위가 이어질 때면 얼어 죽는 거지가 늘었다. 옆에서 같이 자던 거지가 아침이면 죽어 나갔다. 잠들면 자기도 죽을 것만 같았다. 한하운은 무릎을 쳤다. ‘그래, 내가 쓴 시를 파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서울 명동 거리에 나가 시를 팔았다. 소문도 났다. 명동에 가면 시 파는 거지를 만날 수 있다고. 시 ‘개구리’도 명동 어느 찻집에서 누군가에게 판 시다.
그의 시 가운데 ‘파랑새’가 있다. “나는 / 나는 / 죽어서 / 파랑새 되어 // 푸른 하늘 / 푸른 들 / 날아다니며 // 푸른 노래 / 푸른 울음 / 울어 예으리. // 나는 / 나는 / 죽어서 / 파랑새 되리.” 그의 기억에 따르면 이 시는 1945년 8·15 해방 이전에 쓴 시인데, 해방이 된 뒤 함흥 어느 신문사에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는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설 때라 문학판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정리가 될 때이다. 이 시는 ‘반동시’라 하여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다.
남한에 내려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잡지사나 신문사를 찾아가 투고를 해도 거지가 왔다고 문전박대를 하고 쫓아내기 일쑤였다. 그는 이런 일을 겪고 난 뒤 도화지에다 ‘파랑새’ ‘비 오는 날’ ‘개구리’를 써 명동 다방이나 바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한 장씩 팔았다. 백 원도 받도 천 원도 받았다. 하룻밤 사이에 만 원을 벌 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어느 바에 들어갔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 대여섯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에게 도화지 시 ‘파랑새’를 건넸다. “이거 당신이 쓴 거요?” “네. 이거 시가 되건 안 되건 한 장 사 주시오.” 그중 한 남자가 “Green bird!” “Green bird!” 중얼거리면서 한하운에게 같이 있는 사람을 소개했다.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을 날카롭게 본다는 시인들도 green과 blue를 구별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 이분은 정지용, 이분은 이용악인데, 모두 시인이오.” 이러면서 술 한 잔을 권한다. 한하운은 거절한다. 정지용과 이용악을 어찌 모르겠는가. 온몸이 부끄러워 달아올랐다. 진사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었으니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도망쳐야만 했다. 이때 정지용이 한하운 손을 붙잡고 만년필을 쥐어준다. “오늘 밤은 돈이 없으니 이 만년필을 쓰시오.”
(다음 호에 이어서 씁니다)
김찬곤
광주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