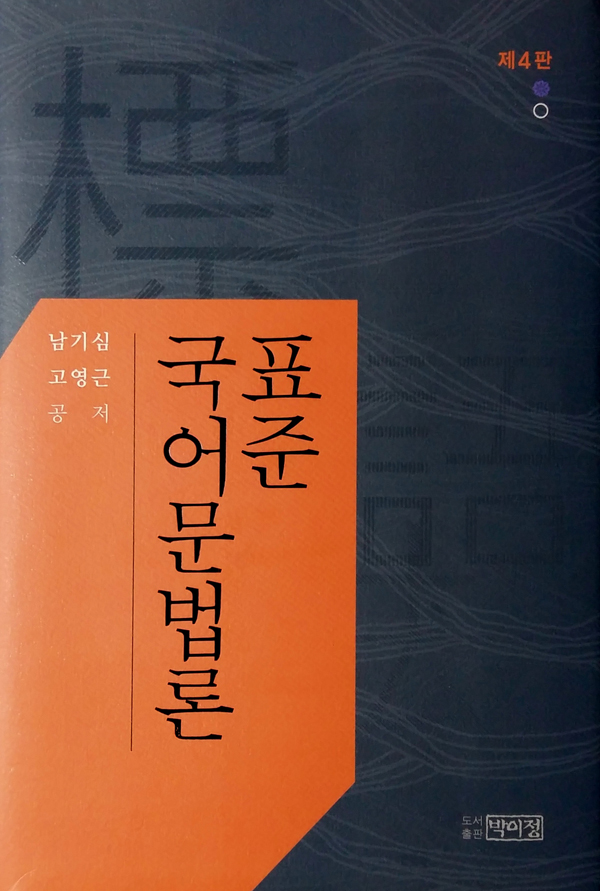
체언이 지시하는 대상이 수효가 하나일 때 이를 단수라 하고 둘 이상일 때 복수라 한다. 영어, 독일어 등의 인도·유럽어에서는 복수의 표시가 동사는 물론, 관사, 형용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數, number) 범주의 설정이 큰 의미를 띠고 있으나 국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의 문제를 크게 다루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어에도 인도·유럽어만큼 현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규칙적인 수 표시의 질서를 찾을 수 있다.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박이정, 2017), 85쪽
우리말에서 명사는 영어처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 범주’가 ‘문법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서정수는, “우리말에서 ‘사람’이라는 단수 명사와 그 복수 형태 ‘사람들’이 실제로 구분되지만 그러한 구분이 문법적인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서술어 따위와의 어울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면서 “적어도 문법 관계로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국어문법’(한양대학교출판원, 1996) 446쪽). 그에 따르면, ‘문법 범주’란 서양말의 전통 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시제, 격, 성, 수 따위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말의 문법 범주는 서양 문법 범주와 다르다. ‘수 범주’만 하더라도 우리말에서는 문법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수접미사 ‘-들’이 붙는 명사가 문장 구조에서 다른 말(동사·대명사 따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복수접미사 ‘-들’을 다룬 문법서를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 서양 말의 문법 범주 ‘수’가 깔려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위 글에서 고영근은 “인도·유럽어에서는 복수의 표시가 동사는 물론, 관사, 형용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數, number) 범주의 설정이 큰 의미를 띠고 있으나 국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의 문제를 크게 다루어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논리에 문제가 있다. 우리말은 명사의 단수나 ‘-들’이 붙는 복수 명사에 따라 동사나 형용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그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느냐’, 하는 점이다. (다음 호에 이어서 씁니다)
김찬곤
광주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