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네스의 완전한 기억과 소설의 본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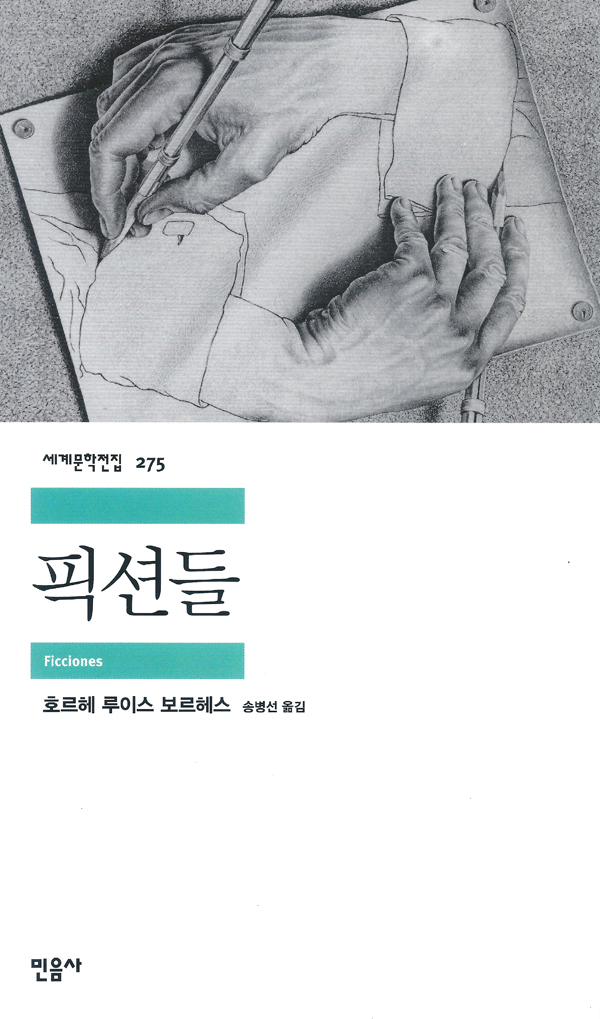
푸네스의 기억력은 타고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백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다. 푸네스는 열아홉 살 때 짙은 쪽빛 얼룩무늬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 증세가 온다. 나을 가망은 거의 없었다.
그는 사고 이전의 자신을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자기도 장님이며, 귀머거리이고 얼간이이었으며 건망증이 있었다”고. 물론 그가 정말 장님이라는 말은 아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보았으며, 듣지 못한 채 들었다는 말이다.
사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의 머리는 아주 맑았다. 말에서 떨어지기 전에도 기억력이 남달랐지만 그에 견주어 지금은 오래되고 사소한 기억도 뚜렷하게 되살려 낸다. 특정한 날짜 ‘1882년 4월 30일’ 동틀 무렵 남쪽 하늘의 구름 모양을 기억하고, 배의 어떤 노가 일으키는 물보라를 다른 노가 일으키는 물보라와 구별할 수 있다. 하루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꼬박 하루가 걸린다. 그는 이런 말까지 한다. “이 세상이 생긴 이래 모든 인간이 했을지도 모르는 기억보다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는 어느 망아지의 헝클어진 갈기, 나무의 나뭇잎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걸 본 순간의 인상마저도 기억한다. 이뿐만 아니다. 그는 3시 14분 옆에서 본 강아지와 3시 15분 앞에서 본 강아지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손을 보고 매번 놀란다. 소리 없이 곪아 가는 잇몸과 충치와 피로를 초마다 느끼고, 그 또한 언제까지나 기억한다. 더구나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한 모든 것’, 심지어 딱 한 번만 생각한 것이라도 그의 기억에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보르헤스는 푸네스가 “사고하는 데는 그리 훌륭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보르헤스에게 사고는 “차이점을 잊는 것”이고,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차이점’은 조랑말과 얼룩말처럼 다른 개체간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조랑말간의, 같은 얼룩말간의 차이를 말한다. 그런데 “푸네스의 비옥한 세계에는 상세한 것, 즉 곧바로 느낄 수 있는 세세한 것만 존재”한다.
(다음 호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김찬곤
광주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

